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우리 팀은 개발자인 나, 대표인 친구 이렇게 두 명이다. 현재 우리는 경기도 하남 미사 신도시에서 살고 있다. 2018년 12월에 이사를 왔으니 이제 햇수로 4년이 넘었다. 서울 한 중심에서 신도시로 짐을 싸 들고 오게 된 계기는 공간에 대한 남다른 기준 때문이었다.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사무실 이사를 결심한 계기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햇빛 드는 창문이 없어서다. 햇빛이 들지 않아 형광등을 상시 켜고 있다 보면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 시간 감각에 둔해지니 밥 먹는 시간을 놓칠 때도 많았다. 창문이 없으니 환기를 위해 사무실 문을 열어 두지 않으면 공기가 금세 탁해져 머리가 띵하게 아팠다.
둘째, 북적거리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산꼭대기같이 높은 곳에 위치했지만, 자동차가 없었기에 통근을 하려면 매일 셔틀을 타야 했다. 셔틀버스는 학생들과 출근 인원으로 매일 만 원이었다. 전쟁이 쓸고 지난 자리처럼 정신이 반 가출 상태가 되어 맨 마지막 셔틀 역에 하차를 하는 일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특히 곤혹스러웠다.
셋째, 따듯한 밥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싶었다. 사무실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식당 아니면 배달 음식이었다. 밥은 제대로 먹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와 친구는 그 점에 불만이 많았다. 행복, 건강, 돈 모두를 잡는 선택지를 고려해 친구와 나는 종종 바깥 음식이 지칠 때마다 도시락을 쌌다.
넷째, 임대료가 결코 싸지 않았다. 서울 중심부의 산꼭대기같이 높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는 매년 점점 올랐다. 과연 이 가격을 오케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같은 가격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관심도 생겼다.

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에 보낸 2015년부터 4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연고가 없는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무실 이사 당일에는 둘 다 몸살+감기에 걸려 한 명은 출발지에 한 명은 도착지에 떨어져 이사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아 이삿짐 아저씨와 영차영차 힘을 합쳐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저녁 6시 넘어 이삿짐을 보내고,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혼자 남았다. 텅 빈 사무실에서 줄자와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치를 논의했던 첫날의 사무실이 생각이 났다. 참 많은 시간을 열심히 보낸 공간이었다. 시원 섭섭한 감정도 들었지만,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두근거리며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았다. (안녕!)
사무실 이전은 성공적 이었다. 걸어서 출근할 때 불어오는 바람과 신도시의 널찍한 공간이 주는 낯선 기분이 재밌다. 새로 이사한 사무실은 창문이 아주 크고, 바깥이 아주 잘 보인다. 바람없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둥둥 떠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배고프면 따듯한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즐거운 공간이 하나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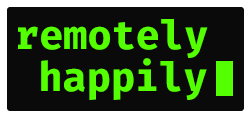
답글 남기기